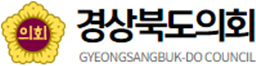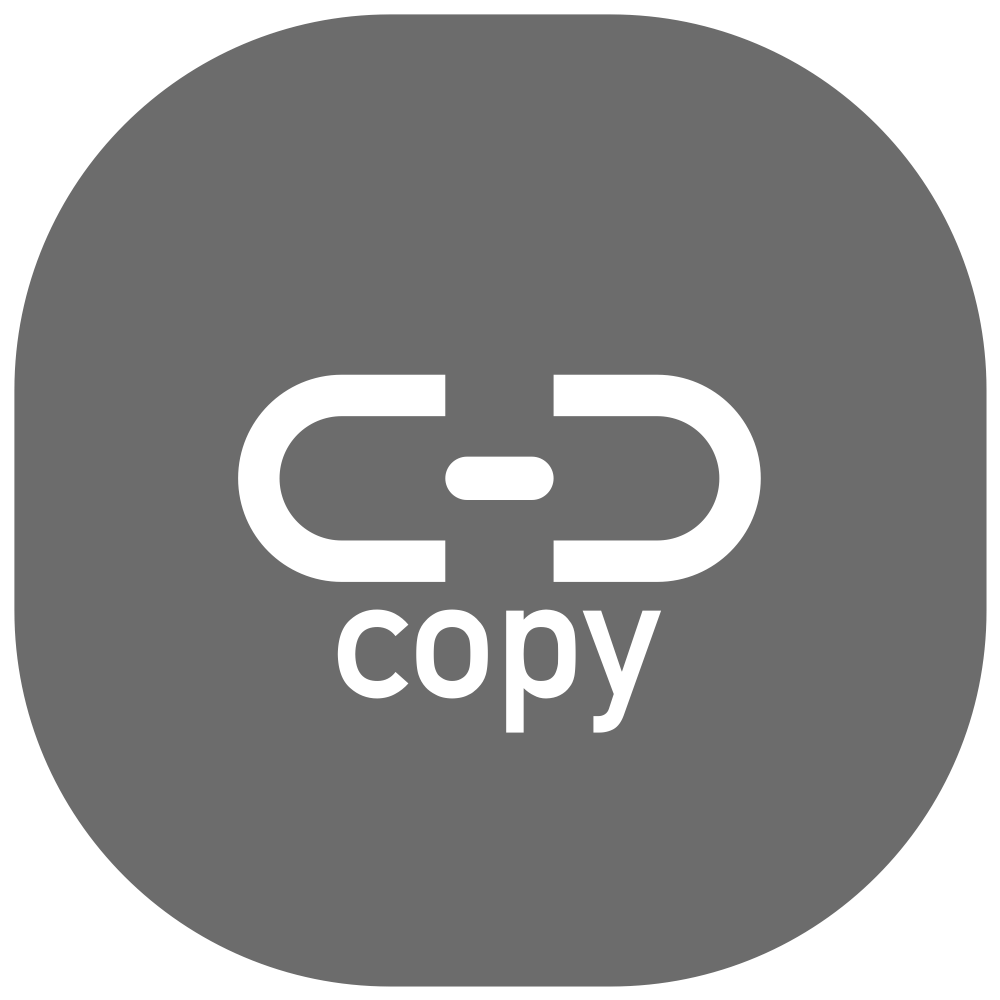본문

황재택
벚꽃은 피었지만,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봄이 왔다. 남녘에서 올라온 벚꽃은 강 건너, 들판 너머, 산자락에도 분홍빛 희망을 피워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이면에 깃든 현실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경북 일대. 뜨겁게 번진 산불은 숲을 태우고, 사람의 일상을 앗아갔다. 산은 검게 그을렸고, 삶은 뿌리째 흔들렸다. 새순도, 들꽃도 피기 전에 스러진 이곳에서, 봄은 상처로 시작됐다.
더 뼈아픈 건, 사람의 손에서 무책임한 방심, 무관심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수십 년 숲의 시간을 삼켜버렸다. 자연의 회복은 느리지만, 사람의 실수는 그보다 훨씬 빠르다.
벚꽃은 그래도 피었다. 재의 언저리에서도, 숯검정 땅 위에서도 꽃은 생명을 틔운다. 그것은 분명 희망이지만, 꽃 한 송이로는 채울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들은 지금, 그 희망을 현실로 전환시켜줄 손길을 기다린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구 대책’을 말하지만, 재해민들이 체감하는 건 여전히 공허한 시간들이다. 발표된 지원은 있지만, 정작 생활의 공백을 메워줄 ‘실질’은 보이지 않는다.
모금은 빠르지만, 분배는 느리다. 국민의 자발적 마음으로 모인 성금이기에, 그 사용에는 더욱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신뢰를 지키기 위한 구조지만, 그 속도와 형식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종종 벽이 된다.
절박한 삶 앞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질문은 조급함이 아니라 생존의 물음이다. 그러니 다시 묻고 싶어진다. 정말,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자연은 스스로 다시 피어난다. 불탄 산자락에도 언젠가는 초록이 돋고, 새가 날아들고, 들꽃이 깃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정책만으로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위로를 넘어 실질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그 시간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벚꽃이 피었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상처 입은 봄 한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연의 탄식과 사람의 눈물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피어난 한 송이 꽃이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피워야 하는가.